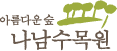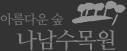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나남신서 1번 | |
|---|---|
| 매체명 : 중앙일보 게재일 : 2003-08-16 조회수 : 8983 | |
|
중앙일보 | 2003. 8. 16.
나남신서 1번
처음은 언제나 힘겹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호기심이 클수록 더한다. 시작을 지시하는 시공의 좌표는 항상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불면의 나날로, 시작이 앞으로의 행보를 규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오는 막막한 두려움 따위로 떠다닌다. 1979년 5월, 박정희 군부체제 비판의 한 우회로로 출판저널리즘을 선택한 청년에게도 처음은 그러했다. 게다가 당시는 군부가 참과 거짓, 선과 악, 미와 추까지도 규정하던 암울한 시대였다. 무엇을 출판할 것인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사실에 흥분과 두려움을 느끼며 1년가량 방향성을 고민하던 그에게 우연히 다가온 책이 버트런드 러셀의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원제, New Hopes for a Changing World)였다. 영어권에서 1951년에 출간된 이 책을 이극찬 당시 연세대교수가 번역해 놓은 원고를 〈중앙일보〉 출판국에 근무하던 친구 이광표 씨가 조 사장에게 건네주었던 것이다.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치상황에서 제목부터 강한 호소력을 지녔다. 미래지향적 영어 제목과 달리 번역 제목에서는 자괴감이 느껴져 안타깝지만. ‘갈피를 잡지 못할 오늘의 상황’이라는 제1장의 제목까지 꼭 한국과 조 사장 본인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하지만 러셀이 건드린 분야는 환경에서 인구ㆍ전쟁ㆍ기근ㆍ에너지까지 실로 다양했다. 이 책으로 인해 정권의 탄압을 받지는 않았으나 곧이어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이 무력 진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조 사장은 정권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렸다. 첫 책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긴 잠에 빠지는 듯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1년이 더 지나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였다. 조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던 이화여대의 소흥렬 교수가 이 책을 교양과목의 교재로 선정했던 것이다. 한꺼번에 3천 부나 팔려 나갔으니, 꼭 횡재한 느낌이었다. 이때 생긴 조 사장의 철학이 ‘좋은 책은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부제였던 ‘희망의 철학’을 제목으로 올리고 판형을 신국판으로 바꿔 ‘나남신서 1호’를 붙였다. 어떻게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는 줄도 모르던 청년은 시골 촌부인 부친으로부터 받은 동양화 소품 한 점을 들고 반포의 선생댁을 찾았다. 그런데 선생댁은 부인인 숙명여대 이영희 교수가 국보위 참여를 거부하였다고 들이닥친 신군부 사람들의 구둣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부인께서는 몸져누워 있어 손님을 집안에 들이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일부러 찾아왔으니 간단히 차나 한잔하자”면서 시작된 선생과의 대화는, 책과 시국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조사장이 가져간 동양화 이야기로 빠졌다. 선생은 동양화를 보는 안목을 갖추고 계셨고, 중국화와 한국화를 비교하며 오랜 시간 말씀하셨다. 선생의 환대를 뒤로하고 선생의 댁을 나서는데 출판하는 일이 이 사회에 보람을 줄 수도 있다는 뜻 모를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흐드러지게 폈던 목련이 봄비에 낙화를 하던 날이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에서 러셀이 역설한 ‘이성에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좋은 책은 팔릴 것이고, 좋은 책을 만들 것이다, 나남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오늘날의 그를 있게 한지도 모른다. 이후로도 선생은 부단한 격려로 청년이 건강한 출판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이어 E. H. 카의 《러시아 혁명》과 미키 키요시의 《철학입문》 등이 나왔는데, 조 사장은 번역물에 치중한 이유에 대해 “저자로 모실 인물들을 많이 알지 못해서도 그랬지만 민족주의 등을 이야기해 줄 용기를 가진 사람이 드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나남신서가 997번까지 기획되어 있다. 1971년에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180여 명 중 정치인 유인태, 환경운동가 최열, 언론인 변용식ㆍ장성효 등 90여 명은 지금도 가끔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그때를 추억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 조 사장은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독서인이 아닌 책 생산자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다”며 “사회상규(常規)와 맞지 않는 책을 낸다거나 건방지다는 비난을 들을지라도 20여 년 전 그때 그 열정 그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글 | 정명진 기자 |
|
| 이전글 | 사회과학 분야의 거대한 산맥, '나남출판' 조상호 |
| 다음글 | 모교 교정에 영원한 스승 芝薰의 동상 세우고 싶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