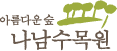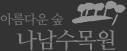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나는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출판敎 신자 | |
|---|---|
| 매체명 : 출판저널 게재일 : 1994-03-20 조회수 : 9067 | |
|
출판저널 | 1994. 3. 20.
나는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출판敎 신자
“나는 요즘 아무 부러운 것이 없어요.”
조 사장의 일성이다. 작년 《김약국의 딸들》로 돈을 많이 벌어서가 결코 아니다. 물론 빚을 갚을 수 있어 좋았고 특별보너스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은 앞으로 2, 3년 출판에 쏟아붓고 나면 가랑잎 바스러지듯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부러울 것 없다”는 말의 더 큰 비중은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콤플렉스 하나를 없앤 점이다. “봐라, 출판으로 돈 벌기로 작정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출판은 안 한다”는.
글 | 정혜옥 기자 |
|
| 이전글 | 광고인, 업계의 공동노력 시급 |
| 다음글 | 사회과학 출판의 한 산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