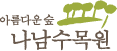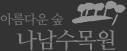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사회과학 출판의 한 산맥 | |
|---|---|
| 매체명 : 출판저널 게재일 : 1994-03-20 조회수 : 9638 | |
|
출판저널 | 1994. 3. 20.
사회과학 출판의 한 산맥
우리 출판계에 물량주의로 승부를 거는 두 출판사를 들라면 아마 고려원과 나남출판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다. 이삿짐 뭉치를 싸듯 책을 싸 들고 홍보용이라며 들이미는 신간 보퉁이는 받아드는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고려원이 편집부의 규모나 책의 내용을 감안하자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나남출판의 경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신문방송학ㆍ광고학ㆍ정치사회학 등 일반대학의 ‘정경대’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출판하는 전문영역도 그렇고, 편집부의 인원이라야 여덟 명, 총무ㆍ영업부 다 합쳐 16~17명을 넘지 않는 규모를 생각한다면 1년에 7, 80종은 남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이를 가리켜 비봉출판사 박기봉 사장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하나를 더 붙여 8대 불가사의를 든다면 아마 한국의 나남출판사의 엄청난 출판량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물량’이 압도적이래서 ‘함량’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로 옮아가는 ‘샘솟는 우물’ 같은 느낌의 신간들이다. 한 권 한 권이 국내 관련학계의 소중한 성과를 담보하고 있으며, 국외저술을 번역할 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만한 선진이론을 받아들이는 출구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남출판이 우리 출판계에 등장한 지 15년이 되는 지금, 당시 우리 출판계의 불모지였던 이 분야는 이제 그 어느 학문분야가 부럽지 않을 만큼 풍부한 책들을 수장(收藏)하게 되었다. “글쎄요, 남들에게는 무리로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일해요.” 방순영 편집과장은 “우리 출판사의 특성을 안다면 별로 이상할 게 없다”고 답변한다. 그에 의하면 저ㆍ역자가 대부분 학자들이다 보니 내용에 손을 대야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저작도 번역도 〈사회비평〉과 같은 반년간지도, 〈사상〉과 같은 계간지도 편집부는 ‘읽기 좋은 편집, 오자 없는 책’을 내는 일에만 주로 신경을 쏟으면 된다는 것이다. 전문학술 출판사들이 다 그렇듯 편집부원들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 분야의 책 만드는 일에 ‘특별한’ 흥미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칫 재미가 덜할 수도 있겠다. 기획회의나 번역ㆍ저술자 선정은 ‘나남신서’, ‘사회비평신서’, ‘사회과학연구총서’ 등의 편집위원들과 그 스스로가 언론홍보학 석사(연세대)이자 출판학 박사(한양대 신방과) 수료자인 사장 조상호 씨의 몫이다. 그러나 나남출판사의 여러 특성은 관련 분야의 내로라는 학자들로 진용이 짜인 편집위원들의 역할도 크지만 ‘대학교재 출판업계의 악마’, ‘난공불락의 불도저’로 불리며, 하는 일의 많음만큼이나 화제 또한 심심찮게 몰고 다니는 조 사장의 출판업자로서의 ‘엄청난’ 노력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남출판의 ‘목록은 곧 조사장의 얼굴’이며, ‘분야는 곧 그의 소신’이고, ‘출판특성은 그의 성격’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관련학계와 출판사에서 그의 이미지는 카리스마적이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 ‘출판은 나의 종교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출판인으로서의 신념 있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목소리 크고, 두 문장에 한 마디는 영어를 섞고, 워낙에 ‘걸진’ 소리를 잘하는 데다, 때론 독설도 마다하지 않는’ 탓에 그를 대충 아는 사람들은 뒷걸음치다 쥐 잡은 뜨내기 출판업자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를 아는 이들은 ‘출판을 알고, 제대로 하는, 그리고 스스로가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보기 드문 출판인으로 나남출판사 조 사장을 꼽는 데 이견이 없다. 서초동 서울교육대학 앞의 일반주택가에 자리한 나남출판사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과 오후 6시 30분이다. 그런데 ‘못 말릴 정도’로 부지런한 조 사장은 출근은 직원들과 비슷한 시간에 하나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11시 전후다. 퇴근 이후의 시간은 예전엔 석ㆍ박사 공부를 했고 박사논문만 남겨놓은 요즘은 강사로 나간다. 14년간을 옆에 있어 사장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한 직원은 조 사장의 쉬는 날은 1년에 설과 추석 두 번뿐이며, 일요일도 오전에 그것도 저자들과 테니스 운동하는 것을 빼고는 회사에 나와 일을 한다고 전한다. 이 출판사에는 사장도 편집부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때론 더하는 듯 보인다. 오역이 보이는 책은 사장이 직접 원문을 대조해 가며 다시 번역하고, 매끄럽지 않은 책은 교열을 본다. 역서도 국내 저작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외국출판사에 서신을 띄워 계약을 맺는 식이다. 지난해 나남출판은 우리 출판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지사를 세웠다. ‘나와 남, 나와 세계, 我와 非我’의 뜻인 나남을 ‘YOU & I’로 표시해 NANAM Publishing House를 설치한 것. 이곳에서는 국내 저작물을 영어로 번역, 외국에 소개하는 업무를 한다. 벌써 다섯 권이 나왔다. 요즘 나남출판은 환경 분야 책을 또 ‘쏟아내고’ 있다.
글 | 정혜옥 기자 |
|
| 이전글 | 나는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출판敎 신자 |
| 다음글 | 사회과학書 집념의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