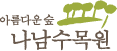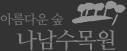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그래 그래, 자작나무숲에 살자 | |
|---|---|
| 작성일 : 18.05.16 조회수 : 1248 | |
|
그래 그래, 자작나무숲에 살자 새삼스럽게 묘목을 심는다. 가까운 미래에 큰 나무가 될 아기 나무를 심는다. 이번 식목일 언저리에 자작나무 묘목 9,000그루를 심었다. 품격 있는 3,000그루 반송밭 뒤편의 산 능선 1만평의 잡목을 베어낸 자리다. 그루터기 나무는 “숲이 내준 환한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하다. 자작나무 숲을 위해 자리를 내준 나무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올렸다. 산이 나무들 키만큼 낮아져 포근하게 안긴다. 눈비 맞으며 성장하면 10여년 뒤에는 제법 늠름한 자작나무 숲의 병풍을 두를 것이다. 지금 수목원에 자리 잡아 요염한 자태를 보이는 자작나무도 20년 전 파주 적성에서 키웠던 묘목 500그루 중 절반도 못되는 생존자들이다. 기품 있고 정갈해 ‘숲의 귀부인’으로도 불리는 자작나무는 성격이 까탈스러운지 큰 나무를 이식해 키우기 쉽지 않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터를 잡아 영생할 수 있도록 5m 간격으로 묘목을 심었다. 나이 70에 대규모로 묘목을 심는 마음은 늦게 철든 욕망을 승화시키려는 또 하나의 발버둥에 다름 아니다. 손자들은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의 기상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년 전, 파주 적성에서 키웠던 자작나무 묘목을 수목원으로 옮겨심은 500그루 중 절반도 못되는 생존자들이다.
자작나무의 껍질이 하얀 것은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한겨울 이 설백(雪白) 수피에 반했다. 청소년기에 접했던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 봤던, 눈 덮인 자작나무 숲의 대향연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닥터 지바고의 애틋한 사랑이 자작나무 숲과 함께 마음 깊게 자리 잡았다. 1992년 일부러 찾아간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생가는 울창한 자작나무 숲 속 자작나무 통나무집이었다. 이 숲 향기의 절대고독이 그러한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켰는지 모른다. 혼인을 “화촉(樺燭)을 밝힌다”고 하는 것도 이 자작(樺)나무를 잘게 깎아 태우는 첫날밤 등잔불로 어둠을 물리치고 행복을 부르는 샤머니즘이다. 기름기가 많은 황백색의 자작나무 속은 깨끗하고 균일해서 팔만대장경 목판 재료로도 사용되었다. 천연 방부제 성분이 함유된 자작나무 껍질은 후세에 전할 부처님의 모습이나 불경을 적는 종이 구실을 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올라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3일간의 대장정 길에서 만난 자작나무 숲의 파노라마
자작나무 원시림을 찾아 5년 전 바이칼 호수 탐방 길을 나섰다. 설날 연휴에 영하 40도 찬바람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그곳에서 맞고 싶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꼬박 3일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갇혀 지내야 했다. 단조로운 레일 위 열차 진동을 자장가 삼아 잠들었다 깰 때마다 차창을 덮치는 자작나무 숲의 파노라마에 압도되었다. 하얀 자작나무 군무가 설원에 현란하게 펼쳐졌다. 나도 한 마리 백학이 되어 춤을 추었다. 바이칼 호수까지는 몽골의 기병처럼 6시간의 눈바람을 헤치고 버스가 달렸다. 영하 40도 혹한의 눈발은 습기가 없이 휘날리며 흩어진다. 이곳도 사람이 살게 마련인 모양이다. 가끔씩 버스를 세워 설원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자작나무를 안아본다. 나무의 온기를 느껴보기 전에 무릎 넘는 눈에 빠진 발이 시리다. 가슴을 열어주지 않는 자작나무가 나를 민망하게 한다. 두꺼운 얼음에 갇힌 바다 같은 바이칼 호수를 둘러싼 아스라한 하얀 눈 언덕에 우뚝 선 자작나무 숲은 때 묻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태고의 음향만 가득한 원시 존재 자체였다. 여기서 자작나무를 ‘하얗고 긴 종아리가 슬픈 여자’라고 노래한 최창균 시인의 ‘자작나무 여자’와 약속해야 했다. 흰 새가 나는 달빛의 길을 걸어는 보려 하얀 침묵의 껍질 한 꺼풀씩 벗기는, 그도 누군가에게 기대어보듯 종아리 올려놓은 밤 거기 외려 잠들지 못하는 어둠 그의 종아리께 환하게 먹기름으로 탄다 그래, 그래 백년 자작나무숲에 살자 백년 자작나무숲에 살자. 이 글의 일부는 2018년 4월 26일 〈한국일보〉의 '삶과 문화' 칼럼에 기고하였습니다. |
|
| 이전글 | 철원 궁예성터의 천년 고독 |
| 다음글 | 노각나무의 하얀 꽃그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