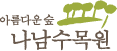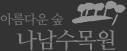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세상 가장 큰 책, 나오시마에서 | |
|---|---|
| 작성일 : 17.08.04 조회수 : 1294 | |
|
세상 가장 큰 책, 나오시마에서 휴가는 나그네 모습으로 떠나야 한다. 힘들게 짬을 내서 휴가라는 이름으로 길을 나서면서도 일상을 벗어난 자유의 깃발 뒤에 벌써 조그만 목적도 숨겨 있다. 여행은 낯선 곳을 찾는 설렘이 먼저이지만, 처음 느꼈던 감동을 모두 갈무리하지 못해 2년 만에 일본 나오시마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아내와 미국 대학교수가 된 아들과 함께여서 더욱 그러했다. 40년 가까이 언론출판으로 살아남았으면 됐지, 지금 또 몇 년째 20만 평 수목원 축성에 매달리는 나의 ‘나무 심는 마음’을 이 섬에 얽힌 아름다운 인연을 빌어 공감했으면 싶기 때문이다. 일본 베네세 출판그룹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손잡고 버려진 땅을 20여 년 만에 예술의 섬으로 일궜다. 학습지 출판으로 축적한 자본으로 산업쓰레기로 덮인 섬을 복원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아버지와, 대를 이은 아들의 꿈이 실현된 곳이다. 바다와 태양과 예술과 건축을 하나로 결합한 문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오시마에 생명을 되돌리고 싶다는 꿈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출판사 모토인 ‘인간답게 살자(베네세)’라는 아름다운 분노의 승리이다.
예술은 눈 밝은 선각자의 후원으로 비로소 꽃을 피운다. 그러나 역사는 후원자보다는 예술가의 작품만 기억할 뿐이다. 우리는 얍삽하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기업가 후원가들 덕택으로 문화창달의 혜택을 누리는 지도 모른다. 10여 년 전부터 조성한 원주 오크벨리의 거대한 한솔 뮤지엄의 안도 다다오의 작품들도 그러하다. 나에게 나오시마는 대기업이 아닌 출판자본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의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한 애정으로 다가온다. 출판을 시작하면서 이 길을 가는 이론적 토대라도 만들라는 권유로 석사 과정을 밟았다. 30년 전 ‘출판인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화두(話頭)로 추상적인 논문을 쓰면서도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황홀한 현장에 지금 다시 서 있다. 예술의 총체로 사회적 기능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 동양을 넘어 세계의 건축가, 예술가, 애호가들이 이곳 벽촌 섬마을을 줄지어 찾고 있다. 영혼의 울림과 떨림과 공감은 동서양을 그렇게 넘나드는지 모른다. 내가 처음 안도 다다오를 접한 것은 15년 전 파주 출판도시에 사옥을 지을 때 건축가의 권유 때문이다. 그의 엄격한 노출 콘크리트 기법과 빛의 미학을 이곳에 재현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아름다운 출판도시 설계를 안도 다다오와 비슷한 건물로 채우려는 건축가들의 조급증이 노출콘크리트의 외관만 가져왔지 그의 빛의 마술은 흉내 내지 못해 동이불화(同而不和)가 된 듯하다.
베네세 사람들과 안도 다다오의 토탈디자인은 예술 작품이 평화롭게 돋보이도록 1987년부터 오랜 시간 미술관을 디자인한 점일 것이다. 베네세하우스 뮤지엄은 폐업한 동(銅)제련소가 있던 섬의 조망이 뛰어난 곳에 고즈넉하게 안겨 있다. 현대 예술품과 이를 담은 안도 다다오의 전시공간 중 어느 것이 더 예술적인가를 가늠하는 생각은 부질없다. 시간을 초월한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훨씬 큰 또 다른 공명과 떨림을 주기 때문이다. 안도 다다오의 의도대로 다리품을 팔며 그냥 그의 빛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 클로드 모네, 월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의 작품 총 9점을 품에 안은 지추(地中)미술관은 더욱 그러하다. 스스로 자유로운 생각이 넘나드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정준모의 표현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평생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심함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죽비소리 같다.”
베네세하우스 뮤지엄에서
지추미술관 입구에서
섬의 복원된 자연환경에 평화로운 내면의 울림이 녹아들게 한 조화의 미학에 기립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지추미술관 앞에 그냥 지나칠 뻔한 길가의 연못이 ‘수련’을 그린 모네의 영혼이 담긴 지베르니 정원과 똑같다고 한다.
지추미술관 앞의 연못
2011년 개관한 이우환 미술관 앞 넓은 잔디밭에 큰 돌과 거대한 솟대 같은 18미터의 오벨리스크의 구성에 주눅이 들었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자궁 같은 미술관도 그이와의 우정인지 명상센터 같은 예술의 합작품처럼 안겨 왔다. 돌과 철과 콘크리트가 묵언의 대화를 하고 점과 선의 연결로 무한한 자연에의 회귀를 염원해서인가 보다. 이우환 화백의 명성을 이곳에서 알게 된 나의 무지가 부끄러워 서울 인사동 옥션에서 그이의 판화 한 점을 구해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이제는 작년에 문을 연 부산시립미술관의 “이우환 공간”이라도 찾을 일이다.
이우환 미술관 앞에서
20여 점의 야외 작품 중 ‘호박’ 작품이 눈에 띈다. 나오시마 항구 앞의 쿠사마 야요이의 ‘점박이 빨간 호박’ 속에 들어가 잠시 바깥공간에 나를 그릴 일이다. 베네세하우스 앞의 잔잔한 지중해 같은 바닷가를 산책하다 불현듯 앞을 가로막는 푸른 물결에 떠 있는 듯한 그녀의 유명한 ‘점박이 노란 호박’이 유쾌하다. 어촌의 조그만 방파제 위의 공간이어서인지도 모르겠다. 현대인의 강박증과 환영(幻影)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 설치미술가의 도트무늬(点)에 대한 상상력의 경지가 끝간 데 모를 감동을 준다.
쿠사마 야요이의 '점박이 빨간 호박' 앞에서
호박꼭지를 잡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 연출했다. 2013년에는 몇 년 전 찾았던 인도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다시 찾았다. 무굴제국의 황제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한 무덤으로 지었다는 대리석 궁전을 손가락을 집어 올리는 사진이 생각났다.
쿠사마 야요이의 '점박이 노란 호박' 앞에서(좌), 그리고 2013년에 다시 찾은 타지마할 앞에서(우)
돌아오는 길에 타카마스 중심지에 자리 잡은 23만 평 규모의 리쓰린(栗林) 공원을 찾았다. 렌터카 운전으로 소문난 모리가(家) 우동집을 찾고, 리쓰린 공원의 이정표를 눈여겨본 아들의 권유가 고마웠다. 이름처럼 밤나무골이 아니라 4백 년 전 조성 당시부터 소나무로 조성된 이 지방 번주(藩主)의 호화정원이다.
리쓰린 공원의 소나무
노송 4백여 그루와 3백 년 동안 손질한 1천여 그루의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6곳의 큰 연못과 조화를 이룬 조경은 경이로웠다.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속설이 깨지는 원대한 일본정원의 현장이다. 소나무들의 거대한 합창이다. 단풍언덕과 함께 한여름을 빨간 꽃으로 수놓는 곳곳의 큰 배롱나무들도 부러웠다. 호숫가의 부부송(夫婦松)이 더욱 그러하다.
리쓰린 공원 호수 앞의 부부송
처음 눈길을 밟아 길을 내는 외로운 사람의 올곧은 정신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단계 성숙한 삶을 살게 한다. 나남수목원 반송밭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 백 년의 시간을 덧씌워보라는 아내의 말이 신선하게 들리는 것은 역사의 한 점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낯선 곳에서 찾은 3백 년의 감동이 내가 꿈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책으로 가슴 가득 안긴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 오늘 밤에도 가야할 먼 길이 있다.
이 글의 일부는 2017년 8월 3일 〈한국일보〉의 '삶과 문화' 칼럼에 기고하였습니다.
|
|
| 이전글 | 역사의 신이 되신 김준엽 총장님 |
| 다음글 | 한여름 100일의 배롱나무 꽃구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