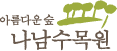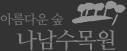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언론의 의병장을 꿈꾸며
나남출판 20주년 기념사
비행기가 몽골의 울란바토르 공항에 가까워져 오자 초원 속에 감춰졌던, 칭기즈칸이 동유럽까지 말을 달렸던 대륙의 길이 선연하게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외우게 했던 제도교육을 바로 이 자리에 닦아세워, 여기서 모스크바 광장과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뻗어 나간 대장정(大長征)의 이 길을 보여주고 싶었다. 분단된 반도의 남쪽에서 동굴에 갇힌 숨 막힐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주눅이 들 때마다 광활한 초원에서 거침없이 달리던 칭기즈칸의 모습은 빛처럼 나를 견딜 수 있게 해준 수호천사였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소박한 신조를 품고 나남출판사의 문패를 내건 지 이제 20년이 되었다. 책 속에서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땀 냄새에 취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책다운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자기암시로 견디어낸 시간들이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밤에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는 시구처럼 나남출판은 필자 스스로의 자연채무(自然債務)를 갚는 마음으로 출판의 창(窓)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인식해 가는 작은 기록이며, 어쩌면 칭기즈칸의 말채찍을 빌려 지적(知的) 유배(流配)의 어두운 동굴을 박차고 나가고픈 자기입증의 궤적(軌跡)일지도 모른다.
출판현장에서 사회적 관행과 편견에 부대끼면서도 출판인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일까를 되새기면서 자신을 지키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으랴만 ‘직업으로서의 출판’은 우선 엘리트의식을 극복하는 겸손을 배워야 했고 ‘책장사’로서의 상인(商人) 모습을 보여야 주변을 자극하지 않았다. 출판은 ‘문화사업이 아닌가’하는 알량한 지적(知的) 최면(催眠)에 승복해 ‘안 팔리지만 의미는 있’는 책을 출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질서임을 체득하여, 나름대로 내건 “나남출판사의 책은 쉽게 팔리지 않고 오래 팔립니다”라는 그늘에 숨어야 하기도 했다. 가끔 ‘어느 장사꾼이 팔리지도 않을 책을 그렇게 출판할 수 있느냐’는 세무공무원의 윽박질을 받으면서 중소제조업자의 맨 아래 자리를 헤매면서도 이 출판이 갖는 무언가의 사회적 지위가 있을 거라는 작은 꿈을 키워야 했다. 상인이면서도 그런 상인일 수 없다고 되뇔수록 상인세계의 냉혹한 질서는 거센 파도가 되어, 권리는 없고 스스로에게 포박한 의무밖에 없는 이 사회과학출판의 발행인이라는 방파제(防波堤)를 그렇게 덮쳐 안으로 멍이 들 때마다 더욱 의연(毅然)해야 했다.
그 시대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징(象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에게도 성장과정을 지켜주신 김지하, 리영희, 김중배, 김준엽 선생님이 그런 분들이다. 그분들과 동시대의 격랑(激浪)에서 먼발치에서라도 사숙(私塾)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음이 틀림없다. 머리가 여물기 시작하던 스무 살의 자서전에는 미륵불이나 큰바위 얼굴보다는 살아 숨 쉬는 신화(神話)로서, 피가 통하는 상징으로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써야 한다.
김지하(金芝河) 시인의 뜨겁고 큰손을 만난 것은 1970년 한전 뒤 명동 흥사단에서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강연에서였다. 소지한 것만으로도 죄가 됐던 담시 〈오적〉을 품에 넣고 그 메시지를 전하러 대구로 광주로 다니기도 했다. 이것은 지하신문 제작과 함께 제적학생의 신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리영희(李泳禧) 선생님은 대학생 토론대회에 심사위원으로 고려대에 오셨을 때 처음 뵈었다. 그때 심어준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개안(開眼)의 희열은 방책선 ‘3번 소총수’ 군대생활을 이기게 해준 《전환시대의 논리》로 이어졌다. 대학원에서 ‘좁고 깊게 연구하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생님의 장쾌한 산맥의 한 자락이나 제대로 보았을까 싶어 마음이 무겁다.
김중배(金重培) 선생님은 〈동아일보〉 인기칼럼 〈그게 이렇지요〉에 ‘미처 못다 부른 노래’를 마지막으로 처절한 유배의식에 젖어 일본땅을 떠돌던 1984년 가을, 동경 외곽의 좁은 다다미방에서 뵐 수 있었다. 암울한 시대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몸을 살라 빛을 키우는 촛불의 자기연소(自己燃燒)만이 여명(黎明)의 새벽을 기약한다는 정론(正論)의 기개를 배웠다.
1986년 《장정(長征) ― 나의 광복군(光復軍)시절》로 김준엽(金俊燁) 총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현대사의 한가운데서 올바른 사관(史觀)을 갖춘 삶의 격(格)을 어른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행운이었다. 출판사에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어른을 가까이서 핍진(逼眞)하게 모실 수도 없었을 것이며, 정의의 승리를 기약하는 역사의 신(神)을 가늠하지도 못한 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대통령의 사진 밑에서 젊은 날을 보낸 나만의 생각이라고 묻어두고 싶지만, 군사문화(軍事文化)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들의 실체를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그것은 당연히 차별화되어 그 지위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준의 하향평준화에 맞춰 남을 폄하(貶下)하며 자신의 의무는 방기(放棄)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절대적 평등의 가치관이 그런 예이다.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이들이 담보해야 할 많은 의무와 이를 지켜내야 할 자기절제의 윤리의식을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객관화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출판을 통해 어떤 권력에도 꺾이지 않고 정의(正義)의 강(江)처럼 한국사회의 밑바닥을 뜨거운 들불처럼 흐르는 어떤 힘의 주체들을 그려보고자 했다. 지난 20년동안 사회과학의 출판으로 제도교육의 껍질 속에 있는 출판계의 구조를 깨뜨려야 했던 힘든 궤적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며 권언(權言)복합체의 권력에 안주하는 제도언론을 대신해서 출판의 언론기능을 수행하여 출판저널리즘을 꽃피워야 했음을 증언하고자 했다.
그러나 항상 위기상황이 닥치면 관군(官軍)은 어딘가 숨고 의병(義兵)이 그것을 감당해냈던 우리 사회의 못난 전통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익명(匿名)의 민중이나 의병이 아니라 당당하게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이겨내 역사의 좌표를 공론장(公論場)에 제시하는 창조적 소수의 실천적 지식인이라고 보고 싶다. 가장 전통적인 언론매체인 출판에 ‘언론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언론ㆍ출판(speech and press)의 정명(正名)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탓하려는 것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출판이 갖는 사회적 지위의 열악함과 그 역할의 퇴색에 스스로 안주했던 게으름과 자기비하가 싫었기 때문이다.
지성의 열풍지대를 함께 꿈꾸었던 이병완, 신계륜을 비롯하여 그동안 애써 주신 나남출판사 식구 여러분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항상 고통의 길에서도 부드러움의 평화로 반려(伴侶)가 되어준 아내에게는 영세받는 일만으로 대속(代贖)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싶다.
반년간 학술지 〈사회비평〉이 1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계간지로 다시 고고(呱呱)의 성(聲)을 올리는 희망찬 날에, 그리고 앞뜰의 송홧가루속에 죽순이 솟는 1999년 봄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