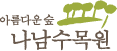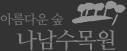연합뉴스 | 2009. 10. 27.
"출판은 사회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알아야"

도서출판 나남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에세이 《언론 의병장의 꿈》 펴낸 조상호 나남 대표.
창립 30년, 자서전 낸 나남 조상호 대표
국내 사회과학 출판을 이끌어온 도서출판 나남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979년 5월 문을 연 나남은 시장에서 외면받기 쉬운 학술 도서를 적극적으로 출간했고 정기간행물 사회비평과 언론과 사회를 발간했으며 시인이자 국학자인 조지훈(1920∼1968)의 이름을 딴 문학ㆍ국학상 지훈상을 9년째 운영 중인 국내 대표적인 사회과학 출판사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자전적 에세이 언론 의병장의 꿈을 펴낸 발행인 조상호(59) 대표를 26일 저녁 만났다. 그는 그동안 보내온 세월에 대해 "그 30년이야 시대에 떠밀려 온 것이지"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면서도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진일보하는 걸음을 걸으려 애써 왔다"고 설명했다.
"이 책이 삶에 대한 넉넉한 에세이는 아니잖습니까. 워낙 시대가 강파르니까 등을 곧추세우고 이겨내려 했던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지금 시대에 없는 것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지요."
1970년대 언론인을 꿈꾸며 상경한 조 대표는 고려대 법학과에 다니던 시절 학생운동에 열성적으로 뛰어들었다가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그는 이후 사상과 자유가 편견 없이 오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언론사 대신 출판사를 택했고 나와 남이 어울려 산다는 뜻의 나남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지난 30년간 그의 꿈은 언론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능을 제도권 밖에서 해내는 것이었다. 책 제목이 《언론 의병장의 꿈》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의병장이란 "익명의 민중이나 의병이 아니라 당당하게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쳐 이겨내 역사의 좌표를 공론장에 제시하는 창조적 소수의 지식인"이다.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악습을 깨려면 민에 무게를 실어 균형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출판이 지금에야 직업이 됐지만, 그때는 완전한 민(民)이었거든. 나 같은 출판쟁이가 이제껏 살아남았으니 지금 출판의 사회적 지위가 그때보다 높아진 거겠죠."
그의 의지는 책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1980년 버트런드 러셀의 《희망의 철학》(이극찬 역)부터 현재까지 1천450권이 나온 나남신서는 책만 봐도 국내 사회과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의제설정이죠. 표면이 아니라 바닥에 깔린 흐름, 저류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출판은 사회 변화의 방향,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해요. 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나남은 아주 익숙한 이름이다. 1980년대 국내 출판사가 거의 관심을 두지 않던 언론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 책을 앞장서서 출간했던 것도 조 대표였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의 꿈이 바로 신문사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웃음) 그 꿈을 못 이뤘는데, 내가 낸 책들을 언론인이 되겠다는 학생들이 본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까 했지요. 그 당시 언론학 책은 다들 돌아보지 않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남에서는 사회과학과 커뮤니케이션학뿐 아니라 인문과학, 문학 책도 꾸준히 나온다. 주요 도서 목록에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광기의 역사》,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장정》(전 5권)을 넘어 《조지훈 전집》(전 9권),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전 21권), 《김약국의 딸들》도 있다.
그는 대화 도중 "에베레스트가 왜 세계 최고봉인 줄 아느냐"고 묻고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으니까"라고 자답했다.
"히말라야산맥에 있으니 에베레스트도 있고, K2도 있는 거죠. 일류는 일류끼리 모이게 돼 있거든. 대붕(大鵬)은 큰 숲에서 깃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출판사가 먼저 숲이 돼야 작가들이 날아오게 돼 있어요."
조 대표는 나남이라는 숲에 날아온 대붕으로 고(故) 박경리 선생을 꼽았다. 《언론 의병장의 꿈》에 실린 첫 번째 글도 박경리 선생과 《토지》다.
그는 이 글에서 《김약국의 딸들》을 출간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끝에 2001년 《토지》를 계약하기까지 박경리 선생과 맺은 인연을 그렸다.
그는 "200자 원고지 2만 8천500장을 수작업으로 한 자 한 자 입력했고 교정을 다시 보는 고난의 행군을 했다"며 "100일 동안 불철주야 오자와의 전쟁을 벌였고 한 문장, 한 단어가 빠진 것을 찾아내는 희열로 출판사 사장이자 주간이자 편집자로서의 자리에 의미를 부여한, 고통의 축제의 나날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출판사란 산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의 맨 아래 위치하며 오가는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는 지식 저수지여야 한다고 믿는 조 대표는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국어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사다 읽는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다.
"15년 쯤 전이죠. 《김약국의 딸들》(나남 펴냄)이 교과서에 실리고 학력고사에 지문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국어 교과서는 빠짐없이 사다 읽고 있어요. 이 교과서를 공부하는 학생이 내 독자라면 어떨까 생각하죠. 그러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 |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