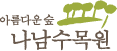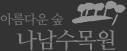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조선일보 | 2009. 9. 5.
[문갑식의 하드보일드] '左右이념의 저수지' 30년… 조상호 나남출판 사장
대학 때 '지하신문' 제작
넝마주이 도피 생활…
海風 속의 소나무처럼 세상을 다 들이마셨다
재수(再修)하러 남도(南道)를 떠났다. 서울 가는 길에 해풍(海風)이 손짓했다. 몇 달 전 고배를 마신 서울공대 건축과, 그게 1969년 6월 그의 목표였다. 그때 그는 운명이 예기치 않게 바뀐다는 걸 몰랐다.
그해 입시원서 사러 가는 친구를 따라나선 게 화근이라면 화근이었다. 고려대를 처음 구경하면서 팔자(八字)가 뒤틀리는 굉음(轟音)을 그는 듣지 못했다. 법대가 제일 좋다는 말에 덜컥 시험 봐 덜컥 붙었다.
고향 떠날 때 목표는 건축과, 몸은 법대, 진짜 꿈은 기자(記者)였던 삶이 이후 거친 파도를 탔다. 그 40년 변화의 결정체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나남출판 지훈빌딩에 도착했을 때 가을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약속 시각이 30분이나 남았으니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입에 담배 문 조상호(趙相浩ㆍ59) 사장이 나타났다. "뭐해? 빨리 들어가자고!" 입맛 다시며 격론의 장(場)으로 끌려 들어갔다.
조지훈(趙芝薰)을 사모해 건물도, 큰아들 이름도 지훈으로 지은 그다. 집무실은 여러 자루 붓에 이름 모를 각종 차(茶) 향내로 그윽했다. 장서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고 창밖으로 풀로 뒤덮인 수로(水路)가 보였다.
그는 이달에 창립 30주년 출판을 한다고 했다. "빨리 읽어보라"며 건네준 원고 제목이 '언론의 의병장(義兵將)을 꿈꾸며'다. 그에게 물었다. "그럼 조선일보는 뭡니까?" 그가 말했다. "(기성 언론은) 관군(官軍)이잖아."
"의병장이 관군은 왜 만납니까?" 조상호는 예상문제가 나왔다는 듯 껄껄대다 말했다. "의병이 관군이랑은 원래 안 싸우잖아?" 느닷없이 관군이 돼 의병장과 말의 공방을 하게 됐다.
고대(高大)의 호메이니
조상호가 가장 좋아하는 언론인이 김중배(金重培)다. 광주고 선배에 동아일보 기자였다. 손은 법서를 뒤적였지만 마음은 그를 닮고 싶어 했다. 그래서 택한 게 법대 지하신문 〈한맥〉. 운동권 기자가 된 것이다.
유신(維新)반대가 시대의 조류였다. 2학년 때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다. 〈한맥〉에 쓴 교련(敎鍊) 반대 글이 필화(筆禍)로 번졌다. 스무 살 청년에게 어마어마한 죄목이 씌워졌다. 지하신문 제작 주모자였다.
―광주고 다닐 때는 이과반(理科班)이었다면서요.
"원래 육사 진학반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일제(日帝) 때 징용 갔다 사할린에 남았어요. 러시아가 소련(蘇聯)이던 시절입니다. 신원조회에 번번이 걸렸습니다."
―필화를 빨리도 겪었습니다.
"당시 청계천 주민들이 경기도 광주(廣州)로 대량 이주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버스 타고 말죽거리 지나 도착한 현장에는 식수(食水)도 없었어요. 미역 구하러 나갔다 돌아온 남편에게 산모(産母)가 아이 삶아줬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그게 정권의 분노를 샀어요. 주모자란 타이틀은 당시 민관식(閔寬植) 문교부장관이 붙여준 겁니다."
―의병장이 유언비어를 막 씁니까? 지금 같으면 딱 소송(訴訟)감인데.
"사실이 아닌 건 알았지요.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는 기사였어요. 파장이 커진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북한 〈노동신문〉에서 제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봐라! 이게 바로 남한의 실상(實狀)이다라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1971년 7월부터 도망 다녔습니다. 친구 한 명과 함께 강원도 원주의 원주천(原州川) 변에 살며 넝마주이를 했습니다."
―넝마주이는 아무나 가면 시켜줍니까.
"선배의 소개가 있었지요. 지금으로 치면 낙하산이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50여 명이 있었어요. 아침밥과 숙소만 제공받고 점심, 저녁은 혼자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붙잡혔겠죠.
"두 달 만에 서울로 올라와 학교 앞을 지날 때였어요.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생각나고 거지왕자 이야기도 생각나고…. 영원히 원대복귀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요.
"고대에서만 21명, 전국에서 176명이 붙잡혔어요. 그들이 나중에 만든 게 71동지회입니다. 저는 군에 강제징집됐고요."
―부적절한 표현 하나로 주모자가 된 건 아니겠죠.
"제 도서 대출 카드까지 샅샅이 살폈어요. 읽은 책이 전부 이념서적이어서 이 녀석 거물이구나 하고 판단했겠죠."
―출세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엉뚱한 데서 이름을 날린 꼴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뭐라던가요.
"저 찾으러 서울에서 광주로 형사들이 내려오고, 부모님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찾으러 다니고. 군 입대한 지 1년 만에 처음 부모님을 뵀어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불효(不孝)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군에서는 잘 지냈습니까?
"제가 7사단 3중대 1소대 3번 소총수였습니다. 그때 끌려간 대학생들은 다 3번 소총수를 시켰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감시하던 보안사 소속 이등병이 하도 성가시게 굴길래 두들겨 팬 겁니다. 그걸로 완전히 거물이 됐어요. 복학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맨 먼저 조사받는 예비검속자로 분류됐으니까요."
―거물 운동권이 쉽게 복학이 됩니까.
"두 학기는 학적(學籍) 없이 수업을 받았지요. 그래도 할 일은 다 했어요. 고시반 반장으로 사시(司試) 준비생들에게 장학금과 하숙비 대주고 출석점검도 했어요. 형사모의재판도 주최하고. 고시반에 홍판표라는 경상도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무신 신고 다니던 그가 하루는 출석 빠진 것 좀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의 홍준표(洪準杓) 의원이에요. 이름을 왜 바꿨는지는 몰라요."
―본인은 사시를 볼 수 없으면서 남을 위해 살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후배들 위해 이런 저런 일하고 운동권 후배들이 상의하러 오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고대 운동권의 호메이니가 됐지요."
입지(立志)
대학은 두 가지를 준다. 입학 때는 꿈을, 졸업 때는 차가운 현실이다. 운동권 낙인 하나 받고 석탑(石塔)을 나설 때 그의 고민은 하나였다. 이화여대 약대에 다니고 있던 지금의 아내(황옥순ㆍ黃玉順ㆍ55)였다.
그의 '구라'에 빠진 아내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마디로 절절맸다는 주장이다. 장인 장모는 달랐다. "직장 없으면 결혼은 어림도 없다"고 했다. 그는 수출입은행 공채 1기로 은행원이 됐다. 1977년이다.
―공부를 꽤 잘한 모양입니다.
"문형, 제가 이래 봬도…. 사연이 있었어요. 남대문서에서 형사가 신원조회를 나왔는데 다른 회사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겠지요. 당시 인사부장이 고대 선배였어요. 그분이 신원보증을 해준 겁니다. 조건은 있었지요. 한 달에 한 번 제 동향을 경찰에 보고해주는 거죠."
―몇 년간 일했습니까.
"1980년 초까지였어요. 심사역이라고 지금의 대리(代理) 직급까지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헬기 타고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공정 체크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속했다면 공채 1기였으니까 꽤 높이 올라갔을 텐데, 내 할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되고 싶었나요.
"고향이 원래 전남 장흥입니다. 〈동아일보〉 사장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창간독자였어요. 창간호에 장미향 나는 잉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언론사 입사시험을 보지 그랬습니까.
"봤죠. 〈중앙일보〉에 응시해 신체검사까지 마쳤는데 신원보증에 걸렸죠. 지금의 김영희 대기자가 감독이었습니다. 외신 텔렉스 쭉 짖어주고 해석하는 게 영어시험이었어요. 〈중앙〉에서 떨어지니 다른 곳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운동권하고는 작별한 겁니까?
"인연이 끊어질 리가요, 고대 후배였던 이병완(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계륜(전 민주당 의원)이 저희 집에 숨어 지냈지요. 지명수배당해서. 서대문 인왕아파트에 살 때인데 경찰이 제집으로 쳐들어왔어요."
―해볼 건 다 해봤군요.
"그런데 그 형사들이 제가 누구인 줄 몰랐대요. 전력(前歷)을 알았으면 저도 붙잡혀갔겠죠. 후배들 도피시키느라 아들 지훈이 안고 잠실에서 화곡동까지 선후배들을 찾아다녔어요. 전부 거절합디다. 제 누나 집에 놔뒀는데 1주일 만에 나왔어요. 누나 집 가정부가 자꾸 쳐다보더래요."
―1979년 5월에 출판사를 세운 것도 수출입은행을 그만두려고 미리 준비한 거군요.
"주변에서는 은행 그만두는 걸 모두 반대했어요. 왜 보장된 출셋길을 걷어차느냐. 아내만 달랐어요. 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가 감히… 하는 식이었어요. 출판사랄 것도 없었어요. 종로 고대 교우회관 귀퉁이에 차렸으니까."
―출판사 중에서 당시로는 생소한 신문방송학, 지금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책을 많이 출간했지요. 무슨 이윱니까.
"제 출판사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기자가 된다면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어요. 한 신문사에 들렀는데 얼굴 모르는 간부가 저를 취재하던 기자를 툭 치며 이러더군요. "나남에서 왔다고 했소? 사장한테 내가 책값 많이 냈다고 전하슈"라고.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출판사를 차린 후 첫 작품이 정현종 시인이 번역한 리처드 바크의 《어디인들 멀랴》지요.
"그건 정 시인이 들고 온 거고, 첫 히트작은 오택섭 교수의 《데이터 분석법》이었어요. 오 교수를 무작정 찾아가 원고를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됐으니 대박을 친 겁니다."
―운동권 책도 냈겠지요.
"미키 기요시가 지은 《철학입문》이란 일본어 서적은 이념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어서 출판했고 E.H 카의 《러시아혁명》, 모리스 뒤베르제의 《정치란 무엇인가》가 초기에 나왔습니다."
―그때 출판사 규모는 어땠습니까.
"저와 신계륜, 영업사원 1명, 경리사원 1명, 편집 교정 사원 1명 등 다섯 명이 전부였습니다."
―출판사 이름 나남이 나(自)와 남(他)의 소통을 위한 이름이라는 데 사실입니까.
"대학 다닐 때 고향 후배들을 위해 나남제(羅南祭)라는 축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따온 이름인데 남들이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해주니 가만히 있어야지요."
거물(巨物)들과의 만남
고1 때 조상호는 광주에서 열린 고대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먼발치에서 한복 차림의 선비를 봤다. 조지훈을 보는 순간 고고한 선비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가 지훈상(賞)을 10년째 이어온 인연의 시작이었다.
오적(五賊)으로 김지하(金芝河)를 알게 됐다. 그를 통해 고려 불교 탱화 연구가인 처 김영주를 알게 됐다. 부부를 통해 장모인 작가 박경리(朴景利)를 알게 됐다. 절판된 《토지》(土地)가 나남에서 나온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고교생 때 한번 봤다고 조지훈을 그토록 존경하게 된 겁니까? 빌딩 이름도, 아들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사숙(私淑)은 그런 겁니다. 선생이 타계하신 지 37년 됐지만 그의 선비정신을 되살리고 싶어요. 7권짜리 《지훈 전집》을 낸 것도 그런 이윱니다. 굽은 노송이 선산 지킨다는 기분으로요."
―제가 나남출판을 알게 된 건 김준엽(金俊燁) 전 고대총장이 쓴 《나의 광복군시절》 때문입니다.
"〈월간 경향〉에 나의 광복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거예요. 제가 책 낸다니 경향에 있던 고대 출신 윤무한 선배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임희섭 고대 교무처장에게 사정했어요. 김 총장께서 우리 졸업생 도와줘야지라고 응낙하셨답니다. 《장정》(長征)이란 제목을 총장님도 좋아했어요. 5만 부가 나갔지만 더 큰 자부심이 있어요. 광활한 대륙을 달리며 항일무장투쟁하던 선구자의 모습을 분단에 주눅 든 젊은이들에게 보여줬으니까요."
―김 전 총장은 한때 총리로도 거론됐지만 끝내 고사했는데…, 지금도 잘 계십니까.
"올해 89세세요. 총리 이야기가 노태우(盧泰愚)ㆍ김영삼(金泳三)ㆍ김대중(金大中) 정권 때까지 나왔지만 모두 말렸어요. 총장님은 민(民)의 상징적 존재로 남으셔야 한다고. 다리 불편한 거 빼곤 아주 건강하세요."
―김지하와의 인연은 학생운동 때문이겠죠.
"명동 입구 흥사단에서 대학 1학년 때 처음 봤어요.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강연이었습니다. 시집 오적을 소지만 해도 죄가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의 메시지를 전하러 대구로, 광주로 다녔지요. 그때의 지하 형은 거의 신(神)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글 하나로 운동권에서 파문당하지 않았습니까.
"운동권 학생들 분신이 잇따를 때인데 사실 주제는 생명사상이었어요. 〈동아일보〉에 보낸 게 빠꾸맞아 〈조선일보〉로 간 겁니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생명사상은 간 데가 없어졌어요. 지하 형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사후 팽팽하던 끈이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생명사상으로 전환하려던 때였는데…."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출판하게 된 사연도 기이합니다.
"지하 형의 부인을 저희는 영주 누나라고 불렀어요. 제 출판사에서 1992년 《신기론으로 본 한국미술사》라는 그분 책을 냈다가 5년 뒤 《한국미술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영주 누나가 어머니의 뜻이니 《김약국의 딸들》을 출판하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했어요. 그제야 박경리 선생이 어머니라는 걸 알았지요."
―왜 그때 당장 출판하지 않았나요.
"《토지》가 당시 출판사와 분쟁이 있었어요. 당시 나남이 그 소설을 맡을 역량도 없었고요. 나중에 인연이 살아났지요. 《토지》보다 《김약국의 딸들》이 더 잘 팔렸는데 제가 인세를 들고 원주에 가면 반가워하면서도 《토지》 인세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담뱃불 붙여 드리면 서너 시간씩 이야기하시곤 했습니다."
―《토지》 원고의 교정을 일일이 봤다면서요.
"원고지 2만8500장을 처음부터 다시 입력했습니다. 100일 동안 불철주야(不撤晝夜) 오자(誤字)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밑줄 긋고 싶은 선생의 문장과 문체에 흠뻑 빠졌어요. 아! 선생은 대시인이구나 하며 얼마나 감탄을 했던지."
―그러고도 초판 5,000질을 전부 회수했지요.
"다섯 번 교정 봤는데 오자가 많았어요. 그 오자들이 만천하에 제 무능을 고발한 거지요. 서점에 나간 책 회수하는 게 어찌나 어렵던지, 누구는 출판의 정직성을 보였다며 거꾸로 선전한다지만 저는 누가 알까 창피해 숨죽이며 뛰어다녔습니다. 돌아온 책들을 작두 칼로 베고 새 책 만드는 데 꼬박 두 달이 걸렸습니다."
―《토지》에 조 사장과 비슷한 인물이 있다면서요.
"주갑이요. 나중에 박경리 선생도 저만 보면 주갑이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당신이 창작했지만 주갑이가 제일 정이 많이 가는데 많이 써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청준 선생과의 인연도 기이합니다.
"재수 때 서울고 쪽에서 하숙하다 신촌역 밑으로 옮겼는데 그 집이 선생의 고교동창 댁이었습니다. 선생도 거기서 하숙을 했대요. 처음 뵌 건 1984년 《이청준 문학선 ― 황홀한 실종》을 낼 땝니다. 1980년 5월 광주가 화두였지요. 그분이 쓴 《비화밀교》라는 중편소설에 나오는 향토사학자 조승호가 접니다. 작년 7월 31일 돌아가시기 1년 전 병상에서 이러시더군요. '몸이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붕 떠있네'라고요."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리영희 선생의 지도를 받았죠. 저도 대학 시절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었습니다만 그는 왜 북의 현실에는 눈감고 남쪽만 비판합니까?
"저는 그분이 중공(中共)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상(思想)의 저수지
조상호는 사상의 저수지를 자임한다. 나남출판이 좌우를 아우르는 거대한 담론(談論)을 담아내겠다는 것이다. 나남은 다른 회사가 엄두도 못 낼 사회과학서를 지금도 내고 있다. 나남신서가 벌써 2,000종을 헤아린다.
2005년 그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 시상식에서 문화부문 수상자가 됐다. ASP(Anti-Government Student Power)에서 정부 공인 문화인이 된 것이다.
―사회과학책 내서 출판사 경영이 가능합니까.
"김현 선생이 이래요. 나남이 세운 지 10년 다 돼도 잘 팔리는 책은 없는데 계속 책이 나오니 일각에서 한 종교단체가 뒤를 봐준다, 중앙정보부에서 봐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형님, 제가 성공한 모양입니다라고요."
―실제로 출판사들은 책 장사보다 땅장사로 돈을 번다면서요.
"맞는 이야긴데 사정을 알아야 해요. 돈 없는 출판사들이 창고를 제일 싼 땅에 사놓잖아요. 그게 나중에 값이 뛰는 겁니다. 제가 지금 통일동산 10만 평 나남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동산 투기 아닌가요?
"김중배 선생이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글 써서 재산 많은 이가 드물잖아요. 문형네 회사 글 쓰는 분도 책이 그리 많은데 신문사 관두면 어디다 놓을 거요. 버릴 겁니까? 내가 나남휴양림에 곧은 언론인들, 작가들 마음껏 글 쓰고 책 놔둘 공간 마련하는 겁니다."
―나남에서 좌파 책이 많이 나왔지요.
"리영희(한양대), 최장집(고려대), 한상진(서울대) 교수 책 때문에 그런 소릴 하는데 그럼 송호근(서울대), 김병국(고려대) 교수와 자유기업원 책은 뭡니까?"
―《백범 전집》도 출간했지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책을 2권이나 낸 출판사는 우리밖에 없을걸요? 가만, (해제를 뒤적이다) 아! 여기 있네. 《일본제국주의의 실상》 《전시중립론》. 9월 중에 손세일 씨의 《이승만과 김구》 2부도 나옵니다. 저는 그분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 머리가 하얘졌다, 1979년 가을 새벽에 배달된 대통령 유고(有故)의 조간신문을 펴들 때 받은 충격은 비할 바도 없었다고 쓴 글을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어떻던가요.
"지하 형하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잠시 멍해졌다고 할까?"
―노무현(盧武鉉),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부음을 들을 때는 어떻던가요.
"제가 《주역》(周易)을 공부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죽을 운명이었어요. 사망 열흘 전쯤 원종이 형(李源宗ㆍYS 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그 얘길 했어요. 우리나라에 유령이 떠돌고 있어요. 섬(島)나라 의식이요. 사상, 노선, 지역으로 갈려 있잖아요. 일본은 원래 섬나라여서 윤리라도 세워졌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지요. 저는 노 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저질스러운 욕망을 떠안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 도매상과 서점 부도가 잇따랐지요. 어떻게 버텼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사정했어요. 100억 원가량의 긴급 자금이 문화예술계에 지원됐는데 우리 출판사는 2000만~3000만 원가량 받은 것으로 압니다."
―좌파정권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문화관광부장관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요.
"김준엽 총장님을 제가 말렸는데요, 나보고 탈영(脫營)하라는 거냐고 일축했어요."
―아무래도 이야길 전부 듣고 보니 좌우를 아우르는 저수지가 아니라 좌파의 저수지 아닙니까.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럼 사상의 저수지는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DJㆍ노 정권과 친했으니 혹시 호남의 저수지는 아닌가요?
"조지훈 선생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럼 혹시 고대의 저수지?
"아유, 아니라니깐."
책 낼 때 그는 항상 갑(甲), 저자는 을(乙)이었다. 을이 된 그는 줄담배에 열변을 토하더니 사무실을 서성거렸다. 문재(文才)가 신춘문예 당선자 못지않다는 그가 취재방식을 문제 삼았다. "인터뷰가 항상 이렇게 취조식이오?"
기자가 말했다. "제가 글쟁이를 싫어합니다. 현학에 형용사나 남발하고. 팩트없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책을 2,000권 낸 조상호는 기자의 글을 데스크 못 보는 게 아쉬운 듯 입맛을 쩍쩍 다셨다.
글 | 문갑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