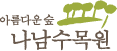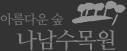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수목원의 사계(四季) | |
|---|---|
| 작성일 : 20.02.12 조회수 : 1139 | |
|
20만 평 수목원 조성에 매달린 지 10년을 넘기자 철마다 연출하는 숲의 풍경들이 풍성해졌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생태계 모습들이 경이롭기도 하다. 그동안 내 눈높이가 부지불식간에 자연에 많이 가까워졌는지도 모른다.
나무들과 씨름하며 그들과 생명의 호흡을 같이하다가, 잠시 찾아오는 망중한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으로 수목원 풍경을 스마트폰에 담기도 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장면들이다. 하루 중에는 동트기 전의 빛이 순하게 곱고, 해질녘의 빛은 신비하게 사진을 받쳐 준다.
사진공부를 하는 아내의 작품까지 협찬 받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목원 사계절 모습 52컷을 엮어 새해 주간週間달력으로 만들어 나누어 가졌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나만의 의식이다. 달력인심도 강퍅해진 세태 탓인지 작년에는 수목원 달력의 인기에 시달리기도 했다. 사진 밑에 몇 자 적은 단상斷想들을 다시 펼쳐 읽으면서 수목원의 파노라마를 떠올린다.
새해 겨울, 폭설 뒷날의 고즈넉한 나남 책박물관의 풍경이 첫 장이다. 이곳은 나남출판 40년의 땀에 밴 4천 권이 다 되는 책들이 한국 현대지성을 증언하고 있다. 책박물관 북카페 입구의 심정수 청동조각상 〈물고기는 하늘을 날고, 나는 배를 저어간다〉가 얼어붙은 호수가 풀리기를 기다리며 어떤 그리움을 더한다. 그렇다. 그리운 것은 그리워 하자.
책박물관 북카페 입구의 심정수 청동조각상.
나남 책박물관 내부.
책박물관 앞 넓은 테라스의 눈 덮인 빈 의자가 희망의 담론을 나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름 모를 도공이 쌓은 5층 석탑과 열두 동자석들도 장송 밑에서 봄을 꿈꾸며 머리에 눈을 얹고 있다. 호수 앞 거목이 된 느티나무는 나목에 피어있는 눈꽃도 아름답다. 눈을 뒤집어 쓴 인수전仁壽殿 앞의 석등이 오히려 평화롭다. 3천 그루 반송들에게 무명無明의 바다를 밝히는 등불인 셈이다. 석등의 옥개석은 조선후기로 오면 팔각지붕을 연출하여 장명등으로 화려함을 뽐낸다.
꽃잔디를 딛고 50년 넘는 철쭉나무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웅자를 뽐내고, 호수 건너 빨간 꽃망울의 철쭉은 아련한 그리움을 부른다.
50년 넘는 철쭉이 활화산처럼 터뜨린 빨간 꽃망울은 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호수를 휘돌아가는 굽은 계단의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에 작은 발자국이라도 남기고 싶다. 후학들이 그 길을 뒤따를 테니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될 일이다. 추사秋史 김정희의 풍사실豊士室 글귀처럼 호수 옆의 공간에 어진 선비들이 가득 차길 기대한다. 동네 친구의 배려로 지난 해 수목원의 새 식구가 된 50년이 넘는 10그루 우람한 철쭉나무에도 눈꽃이 피어 다른 얼굴로 반긴다.
9가지 산벚의 웅자.
그리고 수목원의 봄 풍경이다. 인수전 앞 호숫가 중앙에 자리 잡은 철쭉의 하얀 꽃망울에는 지금 50년 만의 봄이 가득 찼다. 철쭉의 현란한 향기가 하얀 꽃, 붉은 꽃 속에 춤춘다. 날렵한 처마 끝에 걸린 눈들이, 우아했던 정자의 기와지붕이 이제 봄의 향기에 더욱 고와 보인다.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킨 토종 산벚의 위용이 3천 그루 반송들을 보듬고 있다. 커다란 바위 곁의 이 거대한 산벚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수목원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하고 공사를 지휘 감독했다. 꽃비가 열 번은 더 내렸다. 산벚의 봄날은 너무 짧다. 그리고 산벚의 단풍은 너무 빠르다.
야광나무는 야광주夜光珠와 같이 한밤중에도 빛을 낸다. 화려하고 예쁜 꽃으로 벌 나비를 부르며 무르익는 봄을 온통 흰 꽃으로 뒤덮는다. 특히 10미터가 넘는 큰 이 나무는 바위를 감싼 뿌리를 드러내며 당찬 생명력을 발산한다. 새 잎이 길게 갈라지는 아그배나무와 비슷하다.
겨울을 밀어내고 맨 처음 소담한 녹색 잎들을 탐스럽게 내밀며 봄을 증명하다 한두 달 지나면 잎들이 뭉그러졌다가 잊을 만하면 불현듯 우련 붉은 꽃대를 빼어 올린 상사화相思花가 곱디곱다. 잎과 꽃이 서로 보지 못하고 그리워만 한다고 해서 상사화라고 한다.
상사화. 초봄 풍성하던 잎이 뭉그러진 자리에 올라선 꽃대.
책박물관 앞뜰의 석등이 목련꽃 그늘에 서 있다. 석등의 옥개석이 사각지붕인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의 장명등長明燈이다.
석등이 목련꽃 그늘에 서 있다.
내 키를 훌쩍 넘는 진달래나무의 꽃들이 하늘에 춤춘다.
참꽃인 진달래가 나보다 더 큰 키로 하늘가를 맴돈다. 파란 하늘을 캔버스 삼아 꽃들이 군무를 그리는 모습은 우리 수목원에서만 볼 수 있다.
반송 3천여 그루를 호위하는 30명 문인석의 감추어진 미소는 2~3백 년을 견뎌온 소이부답笑而不答의 침묵이다. 3년 전 양평에서 이식한 배롱나무 몇 그루가 추위를 견뎌내고 처음으로 화사한 꽃잎을 매달았다.
오른쪽 끝에 잡힌 배롱나무 꽃. 이 자리에 터를 잡은 신호이다.
박태기 붉은 꽃은 화려한 봄날의 압권이다. ‘밥티기’와 닮은 꽃은 쌀밥보다 서민들의 밥인 조나 수수의 밥알 같다. 꽃이 잎보다 먼저 핀다.
박태기나무의 붉은 꽃은 정열 이상의 염원이 담겨있다.
겹황매화의 노란 물결이 철쭉의 붉은 물결보다 훨씬 어른스럽다.
바위틈에 집단으로 꽂아 둔 겹황매화(죽단화)의 노란 꽃바다가 이른 봄날의 수목원에 넘실거린다. ‘만첩홍도’의 붉은 꽃이 깜짝 놀랄 화려함으로 잔디광장의 봄을 빛내고 있다. 무릉도원의 복숭아꽃도 이런 감흥이었으리라. 장송의 싱그런 녹음과 벚꽃의 꽃그늘 합창 속을 뚫고 치솟는 분수의 청량함에 봄날은 간다.
깜짝놀랄 화려함의 만첩황도의 붉은 꽃이 야성의 함성을 올린다.
인수전 정자 앞의 작은 평화에 안긴다.
여름날 아침 고요의 숲길에 놓인 빈 의자가 누구를 기다린다. 한탄강댐 수몰지역에서 구출한 장년의 느티나무들이 3〜4년이 지나자 이제 새로운 땅에 착실하게 뿌리를 내려 그 푸르름도 짙어졌다.
내 키만큼 잘 자란 수국나무의 하얀 꽃이 한여름 초록의 잎새를 바탕으로 탐스럽게 흐드러졌다. 부처님의 뽀글거리는 머리를 연상케 하여 불두화佛頭花라고도 부른다. 하얗게 피기 시작한 수국 꽃들은 점차 시원한 청색이 되고 다시 붉은 기운을 담다가 나중에는 자색이 된다. 마른 꽃을 달고 새싹이 나올 때까지 겨울을 이겨낸다.
나무 수국 흰색의 아름다움이 한여름을 감싸 안는다.
명징한 흰 꽃이 차츰 붉은색이 된다. 흰색의 축제는 그렇게 짧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한다는 산딸나무의 십자가형 흰 꽃은 가짜 꽃이다.
초여름 산딸나무에 십자모양의 하얀 꽃이 천사를 만난 것 같다. 기독교인들이 이 꽃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우리에게 보이는 하얀 꽃은 벌 나비를 부르기 위한 가화假花일 뿐이다. 가을엔 딸기 같은 둥근 빨간 열매를 맺는다. 밤나무에도 꽃이 피었다. 아카시꽃의 짙은 향내가 사라지면, 어떤 본능 같은 밤나무꽃 향내가 진동하며 가을의 알톨 같은 결실을 약속한다.
수목원 조성 초기에 심었던 호숫가의 40년 된 반송이 홀로 자라 그 위용을 자랑한다. 이제는 호수 주변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만질 수도 있다. 나무처럼 늙고 싶다면 나무처럼 살아야 한다.
목백합나무의 노란 꽃이 수줍은 듯 숨어있다.
40년 전 미국 육사 앞에서 보았던 목백합나무의 노란 튤립 같은 꽃이 수목원에 자리 잡은 지 7~8년이 되자 피기 시작했다. 잎사귀 뒤에 수줍게 숨어 바람결에 잠깐씩 자태를 보여준다.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를 구경하고 하룻밤을 머문 춘양 고택 앞에서 만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목백합꽃을 보며, 시간이 더 쌓여야 하는 우리 수목원 목백합나무의 가까운 미래를 그려본다.
춘양목으로 유명한 춘양의 어느 고택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흐드러지게 꽃 피어 있는 목백합나무.
아내가 정성으로 가꾸는 아름다운 허브 라벤더 꽃밭 주위는 코스모스와 달맞이꽃 군락지이다. 코스모스의 큰 키 높이만큼의 가을 고독으로 홍역을 앓았던 젊은 날의 향수로 마련한 코스모스 군락지이다. 분홍낮달맞이꽃도 진화를 거듭하면 대낮에도 활짝 꽃피우는 붉은 해맞이꽃이 되기도 한다.
허브 라벤더 꽃밭. 분홍달맞이꽃이 백주 대낮에 요염한 자태를 뽐낸다.
꽃무릇이 군락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아내는 고창 선운사의 꽃무릇 군락지를 꿈꾸며 책박물관 가는 길에 1천 개의 구근을 정성스레 심었다.
1천 개 구근을 새로 심었던 꽃무릇이 그 제국의 영토에서 군락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여름 끝자락에 가을의 전령사인 벌개미취와 구절초가 만발했다. 벌개미취는 씨앗을 뿌리고 옮겨심기를 반복하여 수목원 도처에서 군락을 이루어 이제는 우리 수목원의 상징이 되었다.
반송밭 앞 호수에 핀 수련(睡蓮) 연꽃.
인수전 정자 앞의 호숫가. 3칸 정자가 고즈넉하게 산중호수에 안긴다. 갈대가 자란 안온한 늪이 비단잉어의 어린 새끼들도 황새의 공격을 피할 은신처가 된다. 반송밭 앞의 호수를 덮는 하얀 수련垂蓮이 탐스런 꽃을 드러낸다. 잠들지 말라고 비단잉어들이 발가락에 간지럼을 태웠는지도 모른다.
무늬병꽃.
무늬병꽃의 자연스러운 고결함이 5층 석탑을 옹위하고 있다.
낮은 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람한 구상나무가 자태까지 곱기도 하다. 우리 토종인 전나무, 가문비나무와 친척으로 외국에서 원예종으로 개발해 크리스마스트리로 사용한다.
구상나무. 우리 토종의 기상이 가상하여 돌담을 둘러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반송들을 누군가는 푸른 초가집 같다고 좋아한다. 전지하느라고 손이 많이 간 공들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도 더욱 깊어간다. 손길이 많이 간 수목원 인포메이션 센터 앞을 지키는 반송이 제법 우람하다. 요즘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그 옆의 키 큰 느티나무에 눈길이 자주 간다.
나남수목원에서 제일 큰 반송. 그 너머 느티나무도 자리를 잡아 10미터에 가깝다.
맑디맑은 호수에 투영된 단풍나무가 가을을 새롭게 읽어내고 있다. 노란 초롱 같은 꽃으로 봄을 처음으로 열었던 히어리나무가 하트모양의 노란 잎으로 가을의 빛 속을 가른다. 뒤편의 블루베리들이 연출하는 붉은 단풍보다 히어리의 노랑 완성체가 가을의 삽상함으로 더욱 신선하다.
히어리나무의 단풍. 노란색의 절창을 맘껏 부르고 있다.
만추晩秋의 햇살을 받은 반송들의 초록우산이 깔끔하다. 정자 인수전의 기둥과 대들보는 벌써 고풍스런 분위기를 풍긴다. 인수전 현판을 딱따구리인지 새가 적당히 쪼아 놓았다. 어쩌면 이것이 고풍古風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그대로 두기로 했다. 수목원 조성을 당신 일처럼 그렇게 좋아하시는 구순을 넘긴 예춘호 선생이 인수정仁壽亭으로 당호를 써주신다고 한 약속도 은근히 기다려본다. 뒤편의 기장산하氣壯山河는 글의 무게에 눌려 새들이 범접하지 못한 모양이다.
딱따구리가 쪼아놓은 인수전 현판.
다시 설국雪國이다. 한 해가 저문다. 한 해를 늠름하게 열심히 살았는가? 산사山寺를 찾아가듯 저 눈길에 조심스런 발자국을 남기며 ‘세상에 가장 큰 책’을 수목원으로 남기려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늠름하게 가야 하는 새해의 꿈을 키울 일이다.
〈신동아〉 2020년 1월호 |
|
| 이전글 | 노르웨이 숲을 가다 |
| 다음글 | 철원 궁예성터의 천년 고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