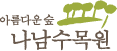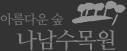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노각나무의 하얀 꽃그늘 | |
|---|---|
| 작성일 : 18.05.16 조회수 : 1174 | |
|
노각나무의 하얀 꽃그늘 사무실에서 20년째 화분에 키우는 철쭉이 화사한 꽃잎을 벌려 제일 먼저 봄을 알린다. 답답한 화분 속에 갇혀 있어도 계절의 감각은 본능이다. 40년 전 이웃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수령 반백년이 넘은 아홉 줄기의 수형이 아름다운 영산홍 화분은 이제 잎만 무성하고 꽃이 맺히지 않는다. 꽃을 낼 만한 양분이 화분 속에서는 부족하다 했다. 가끔은 물주기를 게을리하여 몸살을 앓거나 햇볕 방향으로만 가지를 뻗는 모양이 안쓰러웠다. 큰 화분으로 옮기기를 반복하며 바로 손안에 두고 꽃을 쉽게 보려 한 나의 사치스런 이기심을 탓해야 한다.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나무라고 애지중지하며 너무 오래 실내에 두었다. 가장 아끼는 것은 오히려 자연 그대로 혼자 견디게 해야 한다. 갇힌 자의 고독은 영산홍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몫인지도 모른다. 이번 봄에 수목원 양지 바른 호숫가로 돌려보냈다. 야생의 바람 속에서 자연에 뿌리내려 다시 꽃을 피울 웅자(雄姿)를 벌써 그려 본다. 영산홍이 추위에 약하다는 걱정으로 온실을 만들 때까지 차일피일 미뤄두었던 일이다. 어릴 때부터 실내에서 자랐으니 몸살은 하겠지만 추운 겨울을 스스로 견디며 야생의 본능을 찾아야 한다. 자생할 때까지 서너 해는 겨울철에 나무 전체를 두꺼운 비닐로 감싸 한파를 막아주면 될 일이다. 남쪽의 배롱나무 50그루도 그렇게 조심하면서 두 해째 수목원에 활착시키고 있다.
20년 전 포천 광릉집을 마련하면서 귀하다는 노각나무를 심었다. 히어리 나무를 소개했던 강화도 한수조경의 권유였다. 남도 숲 계곡에서 자라는 이 나무가 중부 이북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했다. 더디 자랐지만 기후온난화의 덕택인지 몇 년 전부터 함박나무 꽃같이 향기로운 흰 꽃을 피워냈다. 초여름 장마철 꽃이 귀한 때라 차나무 하얀 꽃처럼 반가웠다. 노각나무는 배롱나무처럼 줄기가 매끈하고, 모과나무, 백송(白松)처럼 몸통이 아름답다. 줄기 무늬가 사슴무늬를 닮아서 ‘녹각(鹿角)나무’라 불리다가 ‘노각나무’로 되었다는 말도 있고, 중국에서는 비단결처럼 아름답다 하여 ‘비단나무’라고도 한다. 혼자 보기 아까워 올봄 수목원 호수 앞에 옮겨 심었다. 이곳 기후에 충분히 적응했으리라 믿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디지만 큰 나무로 자라 하얀 꽃 그늘을 자랑하기를 기원했다. 마침 부지런한 후배가 집터를 만든다며 구리 토평에서 키우던 5년생 노각나무 백 그루를 보내주어 한 식구가 되었다. 계수나무, 목련, 복자기 단풍 등 3백 그루까지 시집보낸 그의 나무사랑 덕으로 수목원이 풍성해지겠다. 지난가을에는 5년 전에 심은 밤나무 3백 그루에서 탐스런 밤을 수확했다. 양묘업자의 약속처럼 알도 굵고 당도도 높았다. 여러 해가 지나야 결실을 보기 때문에 착한 양묘업자를 만나는 것도 행운에 속한다. 종자로 쓸 수 없게 유전자를 변형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다국적기업의 탐욕에 농심(農心)이 멍드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반송 다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해찰을 부리다가 칡넝쿨의 공격을 받은 엄나무 5백 그루가 거의 고사했다. 묘목 밭을 갈아엎었다. 처음 겪는 일에 못 다 핀 생명의 연민으로 괴롭고 나의 불찰이 미웠다. 비용도 그렇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3년 전 식목일 주변에 엄나무를 기념식수 했던 출판사 직원들이 생명의 경외심으로 같은 자리에 자신의 이름표를 달아 밤나무 묘목 3백 그루를 다시 심었다. 사오 년 후 알토란 같은 밤을 수확하려면 가끔씩 찾아와 안부를 물으라고 당부했다. 나무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기 때문이다. 이 글의 일부는 2018년 4월 5일 〈한국일보〉의 '삶과 문화' 칼럼에 기고하였습니다. |
|
| 이전글 | 그래 그래, 자작나무숲에 살자 |
| 다음글 | 휘청거리는 봄날에 ― 조용중 대기자를 기리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