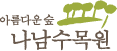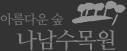매일신문 | 2014. 10. 6.
울진 대왕금강송의 품에 안기다

울진 '대왕 금강송'
사진 | 〈매일신문〉 김태형 뉴미디어 부장

대왕 금강송을 찾아나선 소광리의 금강송 둘레길에서 만난 맑은 물과 천연 숲의 어울림이 소쇄하다.
늙을수록 기품이 더하는 것은 나무밖에 없다. 수백 년의 세월을 늙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감량할 수 없는 시간이며 더해지는 그 기품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다. 나도 나무가 되고 싶다. 8월 초 〈매일신문〉 계산칼럼에 쓴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 군락지에 있는 대왕 금강송의 독자 반향이 클수록 그 현장을 가보고 싶은 욕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상의 질서를 휘둘러 댈 만큼 대왕 금강송 앓이가 깊어졌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800년이 넘는 상상 속의 대왕 금강송이 부르는 손짓에 전율이 스쳐 가기도 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무래도 현장을 가 보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일찍 든 추석이 주는 계절의 감각 때문인지 더욱 무덥게 느껴지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말 울진생태연구소 이규봉 소장을 찾아 산행을 채근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하루에 80명만 입산이 허락된다. 이 소장이 공들여 닦은 금강송 둘레길의 흔적을 따라 오르는 길은 맑은 물과 천연숲의 어울림으로 감동으로 시작되었다. 옛날 보부상(褓負商)들이 그들의 안전과 행운을 빌며 세운 새재를 넘기 전의 서낭당인 조령성황사(鳥嶺城隍祠)까지는 그랬다. 울진의 해산물을 손에 든 보상과 등짐을 진 부상들이 떼를 지어 이 길을 통해 넘나들었을 것이다.



조령 성황사
아직까지는 왕복 4시간의 산행의 고통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중부지역의 천이과정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수인 사어나무가 거목이 되어 버티고 있다. 서어나무 건너편 서낭당 위의 길이 대왕송을 찾아가는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었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동네사람들이 송이를 따거나 약초를 캐러 드나드는 흔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무릎 높이의 산철쭉 군락을 헤치며 신갈나무의 녹음에 묻히다가 잠시 고개를 들면 곳곳에 하늘까지 쭉쭉 뻗은 금강송의 자태에 압도되면서 오르고 또 올라야 했다. 신갈나무 군락과 금강송 군락이 교차하며 그 위용을 뽐낸다. 300년이 넘는 금강송 밑동에는 일일이 관리번호를 페인트로 크게 써 놓았다.


3백 년이 넘는 금강송 밑동에는 일일이 관리번호를 페인트로 크게 써 놓았다.

한 사람 서 있기도 힘든 산등성 바위틈의 간극을 메우며 솟아난 금강송의 기품도 여전하다. 몇백 년의 세월의 두께를 가슴으로 안는다. 자연은 그렇게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감량할 수 없는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계속 능선을 타야 한다. 대왕 금강송을 알현하는데 이까짓 땀투성이의 피곤쯤이야 하지만 헉헉대기는 마찬가지다.



잠시 고개를 들면 곳곳에 하늘까지 쭉쭉 뻗은 감강송의 자태에 압도되면서
'대왕 금강송'을 알현하기 위해서는 오르고 또 올라야 했다.


한 사람 서 있기도 힘든 산등성이 바위틈의 간극을 메우며 솟아난 금강송의 기품도 여전하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의 그림 몇 컷이 스친다. 경주 석굴암의 일출을 보러 새벽같이 일어나 지그재그 산길을 더듬으며 한두 시간 토함산을 올라야 했다. 석불의 이마에 박힌 금강석에 비추는 첫 햇살을 찾기 위해 신라 김대성의 눈높이를 가늠해 보며 땀을 닦던 시절이었다. 가슴 벅찬 일출의 감동을 위해 그렇게 미명(未明)의 산길을 올랐던 것이다. 지금은 석굴암 바로 곁까지 자동차가 올라온다. 그리고 자연에 드러났던 웅장한 석불은 어두컴컴한 유리상자에 갇혀있다. 아주 편해지긴 했다지만 그때 땀범벅의 눈에 비친 솟아나던 첫 태양의 감동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왕자 금강송'. 나무 뒷등에는 불에 탄 흔적이 몇백 년째 그대로 있다.
절반쯤 올라온 모양이다. 이 소장이 왕자 금강송이라 이름 붙인 4, 5백년쯤 된다는 거목 앞에서 빵 몇 조각으로 점심을 때운다. 왕자 금강송 등 뒤는 어느 때인지도 모를 산불에 탄 흔적이 새카맣게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이 화염을 극복하고 더욱 하늘을 향해 용트림하는 기상이 더욱 뭉클하다. 부디 강건하여 몇백 년 후에는 대왕송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해 본다.

한 차례 산 능선을 헛도는 수고는 했지만 대왕 금강송이 알현을 허락했다. 태고의 정적이 감도는 800m 안일왕산(安一王山)의 정상 가까이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황장목을 감싸고 있는 태고의 신비에 압도되어 나도 모르게 큰절을 올렸다. 귀기(鬼氣)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800년이 넘는 대왕 금강송이 세월의 철옹성 너머의 권위의 빗장을 풀고 세속에 물든 나를 포근하게 품어준다고 편하게 생각했다. 자연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품위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 속세의 우리는 얼마나 왜소하고 왜소한가. 먼 훗날 또 다른 나그네가 이 자리에서 나처럼 무릎을 꿇고 위안을 받을지도 모른다.
대왕 금강송을 오랜 세월 지탱하고 있는 드러난 뿌리가 감동이었다. 햇볕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신갈나무 등 활엽수에 쫓겨 산등성이 주변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고통의 흔적들이다. 사람 허벅지 크기의 탄탄한 뿌리들이 얽혀 낭떠러지의 경사면을 극복하며 대왕송이 하늘을 향해 곧게 솟을 수 있도록 다잡아주는 현장이다. 평형을 유지하며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살아남게 한 몸부림의 흔적에 가슴 뭉클하다. 잠깐 스치는 우리의 삶도 비뚤어진 세상에 우리를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수많은 이런 뿌리들이 각자의 가슴속에 얽히고설켜 있는지도 모른다.

'대왕 금강송'의 머리가 하늘에 닿아있다.
원시림을 헤쳐나가야 하는 서너 시간의 산행이 고달파서인지, 시간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아서인지 대왕 금강송을 알현하는 길은 속세의 길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산림학자나 산림청 전문가들도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모양이다. 대왕 금강송의 추정수령도 꼭 집어 800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다. 전문가들의 현지 실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런 환경조건을 이겨낸 세월이 천년이라고 해도 그냥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 위엄과 기품이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황장목이 뿜어내는 신비를 한 가슴으로 안는다. 아무래도 사진만으로는 태고의 음향과 바람과 그 기운을 같이 전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지금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는 가지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나무다.
먼 훗날 또 다른 나그네가 이 자리에서 나처럼 무릎을 꿇고 위안을 받을지도 모른다.



탄탄한 뿌리들이 얽혀 낭떠러지의 경사면을 극복하며 대왕송이 하늘을 향해 곧게 솟을 수 있도록 다잡아주는 현장이다.
평형을 유지하며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살아남게 한 몸부림의 흔적에 가슴 뭉클하다.
잠깐 스치는 우리의 삶도 비뚤어진 세상에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수많은 이런 뿌리들이 각자의 가슴속에 얽히고설켜 있는지도 모른다.




천년의 고독, 대왕 금강송
이제는 또 천년의 고독 속에 의연하게 이 자리를 지키실 대왕 금강송을 두고 다시 속세로 하산해야 할 때이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또다시 만나랴 싶지만, 불경스러운 바램이지만 나도 이 나무 밑에 묻히고 싶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의 소원을 빌어본다. 천세 만세 강건하소서.
소나무 첫 경험
다음날은 혼자서 삼척시 미로면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5대 조모를 모신 연경묘를 다시 찾았다. 이곳은 내가 소나무에 처음 눈을 뜬 곳이다. 25년 전 출판사 직원들과 강원도를 여행하던 중에 우연히 찾은 곳이다. 그때 백두대간인 두타산(1,353m)이나 청옥산을 찾으려고 계획한 일은 아니었다. 두타(頭陀)는 세속의 번뇌를 버리고 청정하게 불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청옥산은 임진왜란 때 유생들이 일으켰던 의병정신이 죽지 않았다는 뜻에서 나왔다. 두타산의 절경인 설악산 천불동 계곡과 견주는 무릉계곡을 구경했다.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가 두타산성에 은거하며 한민족이 단군을 시조로 한 단일민족임을 처음으로 밝힌 역사책 〈제왕운기〉(帝王韻紀)를 저술했다. 부근의 아담한 절집 삼화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하나로 통일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곳이라 한다. 유서 깊은 고찰이지만 거듭된 전란 속에 많이 소실되고, 1979년에 원래의 절터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절 앞이 ‘석장암동’이라 불리는 1,500여 평의 넓은 바위인 무릉반석이다. 반석 여기저기에 새겨진 수많은 명필가들의 글씨가 세월의 한계를 뛰어넘어 잔물결에 흔들리고 있다. 삼척부사였던 양사언의 “무릉선원 중대천석 두타동천”이 두드러졌다.



우연히 금강송 군락지인 연경묘를 들른 것은 내 삶에서 엄청난 행운이었다. 여기 하늘을 찌를 듯한 쭉쭉 뻗은 황장목 미인송을 접하고 천둥 같은 깨달음으로 소나무를 새롭게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지구에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내가 이제야 처음 알고서 ‘유레카’라고 외쳤을 뿐이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라는 선구자의 노랫말의 소나무나, 굽은 솔이 선산 지킨다는 고즈넉한 와불이나, 수원 서울농대 소나무 숲길의 장송이나, 작고 구불구불한 안개 낀 경주남산의 소나무가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전부였기 때문이다. 우물 안 개구리가 따로 없었던 셈이다. 그렇게 일상에 시달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북등을 안고 곧게 뻗은 미인송을 만나는 행운도 있다.
울진의 금강 대왕송을 힘들게 알현한 다음의 정기가 용암처럼 꿈틀거리고 있어서인지 처음과 같은 감동은 덜 했지만, 나를 처음으로 개안(開眼)해 준 올곧게 보존된 미인송들을 다시 만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변의 준경묘도 새삼스럽게 찾아보려다가 그만두었다. 울진 대왕송의 황홀한 해후의 나른한 피곤을 그냥 즐기고 싶기도 했다. 2009년 광화문과 숭례문 복원시 황장목 20여 그루가 준경묘에서 충당된 것이다. 밖에서는 2층으로 보이지만 바닥에서 천정까지 뻥 뚫린 경복궁 근정전의 주심이 27미터라고 한다. 족히 30미터가 넘는 대왕송 원목이 필요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삼척항의 곰치 해장국의 상큼한 갯내음이 아직도 입안을 감돈다. 그 가게에 크게 써 붙여놓은갯사람의 좌우명이라는 “얍쌉하게 살지 말자”는 여운과 함께.
사진 | 매일신문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