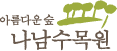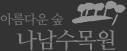| [이 책을 말한다]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 보기 | |
|---|---|
| 작성일 : 05.11.07 조회수 : 1778 | |
|
이코노미스트 | 812호, 2005. 11. 7.
[이 책을 말한다]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 보기
노비와 임금의 우정,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 1, 2》, 김종록 지음 무용담을 내세운 활극과 멜로물이 난무하는 시절에 철학과 과학정신을 아우르는 통쾌한 작품을 만나 즐겁다. 세종과 노비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이라는 우직한 사나이들의 우정과 충성을 담은 김종록 장편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 1, 2》(랜덤하우스중앙, 2005)가 그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몇 줄 비치지도 않는 장영실에 혼을 부여해 우리 앞에 거인의 뜨거운 심장을 박동케 한 작가의 창조성이 부럽다. 그리고 문득 잊혔던 밤하늘의 별들 속에서 나의 북극성을 되찾게 해준 작가가 고맙다. 장영실은 천리마였고 세종은 백락이었다. 천리마는 언제나 있지만 백락은 늘 있지 않다. 천하의 영재들은 늘 나고 죽는다. 천리마 역시 수도 없이 길들여진다. 하지만 그들을 불러 모으고 각각의 자질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백락은 몇백 년에 단 한 번 세상에 온다. 하늘의 변화를 독자적으로 관측하고 이 땅에 맞는 역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농경사회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 그런데 천문역법은 천자라 불리는 중국 황제의 고유권한이었다. 오늘날 핵문제와 비견되는 비밀 프로젝트가 마련됐고 이에 장영실이라는 천리마가 필요했다. 오직 중화라는 상상의 제국 속에서 독점하고 있는 그 하늘을 훔치고 싶었다. 천도의 운행을 알고 싶었다. 그 하늘을 열고 싶었다. 하늘은 별이었고, 그 하늘에 의존하고 싶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별을 다스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별에 복종한다. 미지의 세계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과 함께 개척의 가능성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거진 숲속에서 처음 길을 내며 가는 사람은 먼저 마음속으로 길을 구상한다. 꿈을 꾸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 꿈을 현실로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의 독립선언을 돌에 새겨 경회루 뒤란에 천문도를 세운다. 조선의 하늘을 연 것이다. 이로써 통치철학적 기반이 마련되고 각 분야에 걸친 대혁신이 펼쳐진다. 그러나 강대국 명나라 사신에 발각돼 천문도를 헐어내고 그 자리엔 후궁처소를 세워 조선의 명운을 보존한다. 열렸던 조선의 하늘은 다시 닫히고 중세의 암흑 속으로 빠져든다. 왜 지금 다시 세종인가? 이 책은 요즘 부쩍 커진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에 답답해하는 우리나라 모양을 읽어낸 것 같다. 세계시장에서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는데 사회제도나 의식은 아직 약소국의 그늘에 그대로 있다. 서구 사회의 선례를 인용해야 안심했던 관료들이나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독창적인 한국 사회의 성공 사례를 읽어내지 못해 당황해한다. 처음 하는 경험이기에 익숙한 것에서 탈출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콤플렉스의 미망에 빠져있는지 모를 일이다. 대기업의 세계경영만이 아니라 세계 일등 브랜드를 가진 중소기업도 그 수를 헤아리기 벅차다. 삼성전자ㆍ포스코ㆍ현대차 등의 신화 창조는 이제 신화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지적재산권협회에서는 세계특허를 받으려면 한국의 특허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리 IT산업의 창조성이 세계 공인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
|
| 이전글 | [이 책을 말한다] 천자문에 숨어 있는 동양의 권력과 문화 |
| 다음글 | [이 책을 말한다] ‘느림’과 ‘비움’의 1099일 |
|
|